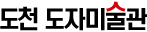제2회 경상북도 우리그릇 전국공모전 심사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183회 작성일 23-12-13 18:13본문
대상 선정에 대한 평
작년 수상작이 우리에게 던졌던 유희성을 기억하는가. 예술적 완성도가 다만 아주 특별한 기법이나, 아주 희귀한 소재 혹은 유달리 튀는 성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다.
올해도 <우리그릇공모전>은 전통적 기준의 폐쇄적인 입장을 버리고 흐르는 시간과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찻그릇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구천요의 구진인 작가는 이 시대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디에 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모든 완성이 정형(定形)일 필요는 없고, 반대로 자극적일 정도로 파형(破形)일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물레를 쓰든 쓰지 않든 이 시대는 어느 것이든 품을 수 있고, 어둡든 밝든 우리 세상을 해석해 줄 이해가 열려 있다. 이 찻그릇은 둘 다에 해당하며 동시에 별로 상관없어 보이기도 한다. 더 정확하게는 상관없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 그릇은 친숙하다. 이미지와 소재가 마치 어머니가 묵히시는 장맛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각의 길다란 몸통과 검은 육체미가 그러한 친숙함에 너무 빠지는 것을 경계하게 만든다. 감각은 현대적이되 소재는 우리 것에 걸맞다.
이 그릇에서 당신은 순간적으로 일본을 느끼고, 일순간 중국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의고, 현대성의 가치다. 너와 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공감대란 이러한 것이다. 이 어찌 진지하면서 동시에 즐겁지 아니한가.
----------------------------------------------------------
총 평
지난 수 십년의 세월간 찻그릇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다. 찻그릇은 이래야 한다는 틀이 우리를 제한의 틀에 가두었고, 그러한 틀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는 이들을 배척한 까닭에 시도는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시간은 흐르고, 경험은 쌓이며, 벽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차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 벽을 느끼고, 쓰다듬고, 너머를 기웃거리지만 좀처럼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 더러는 넘어서고, 더러는 무너뜨리지만, 다수는 포기하거나 그 앞에 멈춰선다. <우리그릇공모전>은 시야를 넓히고, 기회를 확장하고, 시도를 응원하는 자리다.
올해는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전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양면성을 품고 있다. 바탕이 없는 진척은 존재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이름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기도 한다.
올해의 경향성은 전통에 국한되었던 지난 세월의 기준과 결과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분야가 섞이기 시작했고, 엄격하고 진지하기만 했던 도자기에서 재미라는 경향성이 녹아들기 시작했다. 예술의 절반은 진지함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유희성이다. 비로소 우리 시대의 작가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일까.
다만 그렇게 전체적인 경향성에 마냥 만족하기에는 다소 회화적 혹은 입체적 조형성에 대한 벽을 허무려는 적극적인 시도는 아쉬웠다. 아직 그곳에까지 이르기에는 우리 도자계가 뚫고 나아가야 할 회화성과 조소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현실로서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작년 수상작이 우리에게 던졌던 유희성을 기억하는가. 예술적 완성도가 다만 아주 특별한 기법이나, 아주 희귀한 소재 혹은 유달리 튀는 성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다.
올해도 <우리그릇공모전>은 전통적 기준의 폐쇄적인 입장을 버리고 흐르는 시간과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찻그릇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구천요의 구진인 작가는 이 시대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디에 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모든 완성이 정형(定形)일 필요는 없고, 반대로 자극적일 정도로 파형(破形)일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물레를 쓰든 쓰지 않든 이 시대는 어느 것이든 품을 수 있고, 어둡든 밝든 우리 세상을 해석해 줄 이해가 열려 있다. 이 찻그릇은 둘 다에 해당하며 동시에 별로 상관없어 보이기도 한다. 더 정확하게는 상관없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 그릇은 친숙하다. 이미지와 소재가 마치 어머니가 묵히시는 장맛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각의 길다란 몸통과 검은 육체미가 그러한 친숙함에 너무 빠지는 것을 경계하게 만든다. 감각은 현대적이되 소재는 우리 것에 걸맞다.
이 그릇에서 당신은 순간적으로 일본을 느끼고, 일순간 중국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의고, 현대성의 가치다. 너와 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공감대란 이러한 것이다. 이 어찌 진지하면서 동시에 즐겁지 아니한가.
----------------------------------------------------------
총 평
지난 수 십년의 세월간 찻그릇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다. 찻그릇은 이래야 한다는 틀이 우리를 제한의 틀에 가두었고, 그러한 틀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는 이들을 배척한 까닭에 시도는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시간은 흐르고, 경험은 쌓이며, 벽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차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 벽을 느끼고, 쓰다듬고, 너머를 기웃거리지만 좀처럼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 더러는 넘어서고, 더러는 무너뜨리지만, 다수는 포기하거나 그 앞에 멈춰선다. <우리그릇공모전>은 시야를 넓히고, 기회를 확장하고, 시도를 응원하는 자리다.
올해는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전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양면성을 품고 있다. 바탕이 없는 진척은 존재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이름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기도 한다.
올해의 경향성은 전통에 국한되었던 지난 세월의 기준과 결과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분야가 섞이기 시작했고, 엄격하고 진지하기만 했던 도자기에서 재미라는 경향성이 녹아들기 시작했다. 예술의 절반은 진지함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유희성이다. 비로소 우리 시대의 작가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일까.
다만 그렇게 전체적인 경향성에 마냥 만족하기에는 다소 회화적 혹은 입체적 조형성에 대한 벽을 허무려는 적극적인 시도는 아쉬웠다. 아직 그곳에까지 이르기에는 우리 도자계가 뚫고 나아가야 할 회화성과 조소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현실로서 자각해야 할 것이다.